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강화 / 시인 함민복
오태진 수석논설위원 tjoh@chosun.com
비가 내리자 동막해수욕장 갯벌은 더 짙은 잿빛을 띠었다. 뻘밭에 실핏줄처럼 퍼져 있는 물골들도 비에 불어 더 굵고 또렷해졌다. 함민복이 '물의 뿌리'라고 불렀듯 물골은 일제히 뻗어나가 바다를 풍요롭게 한다. 강화도 서남단, 마니산 남쪽 자락 동막해변엔 여의도 스무 배 되는 갯벌이 펼쳐진다. 물이 빠지면 4㎞를 나가야 바다를 만난다.
함민복과 함께 해변 동쪽 분오리 돈대(墩臺)에 올랐다. 비도 잊은 채 갯벌에 쪼그리고 앉아 칠게며 조무락조개를 잡는 어른 아이들이 깨알 뿌려놓은 것 같다. 강화 해안선을 빙 둘러가며 들어선 53개 진지(陣地), 돈대는 위기마다 외침(外侵)으로부터 민족을 수호했던 보루 강화도의 상징이다.
돈대를 지키던 할아버지가 함민복을 보더니 반색한다. "함씨, 웬일인가?" "할아버진 어쩐 일이시꺄?" 그의 입에서 강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주차장 과일노점에 모여 있던 동네 노인들도 반기더니 "벌써 가느냐"고 아쉬워한다. 동막해변은 그가 강화에 와 자리 잡고 12년을 산 곳이다.
그는 1995년 늦가을 새벽 마니산에 올랐다가 반해버렸다. 산은 단풍으로 붉게 물들었고, 아래 논은 노랗게 익었고, 그 너머 바다는 파랬다. 서울 금호동 달동네 단칸방에 살던 시인은 이듬해 대산문화재단 창작지원금 500만원을 받자마자 마니산 기슭으로 달려왔다. 동막 언덕 빈집을 월세 10만원에 얻었다. 방 넷에 텃밭까지 딸린 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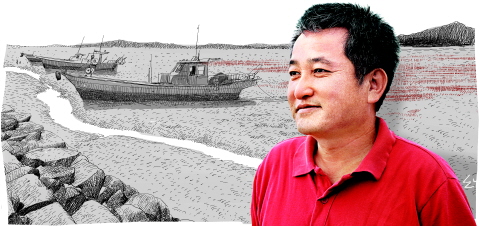
- ▲ 일러스트 이철원 기자 burbuck@chosun.com
가운뎃방은 새는 빗물에 들보가 삭아 부러지면서 내려앉았다. 사랑방은 오래 불을 때지 않아 구들장이 주저앉았다. 그래도 마냥 좋았다. 마당 고욤나무 아래 앉아 바다를 보고 있자면 고욤 따 먹으러 콩새가 날아왔다. 고욤이 익어 떨어지면 산에서 너구리가 내려왔다. 따로 떨어진 변소, 못 박아 걸어둔 화장지엔 딱새가 올라앉아 잠을 청했다.
함민복은 워낙 숫기가 없어 동네 사람들에게 말도 붙이지 못했다. 갯벌을 날마다 3~4㎞씩 걸어나가 소라를 주워 왔다. 원고 부탁하러 출판사에서 삐삐 호출이 오면 몇백m 떨어진 해수욕장 공중전화까지 갔다 오곤 했다.
한 일년 지나니 동네 사람들이 말을 걸어왔다. "하는 일 없이 왔다갔다하려면 일이나 도와라"고 했다. 버섯 비닐하우스 일도 거들고, 함께 배 타고 나가 품도 보태고, 갯벌에 말뚝 치고 숭어 그물 매는 것도 도왔다. 동네 손위 형들은 그를 "함씨" "함 시인"이라 불렀고 손아래 동생들은 그를 "형님"으로 따랐다.
"형님 내가 고기 잡는 것도 시로 한번 써보시겨/ 콤바인 타고 안개 속 달려가 숭어 잡아오는 얘기/ 재미있지 않으시껴 형님도 내가 태워주지 않았으껴/ …/ 그러나저러나 그물에 고기가 들지 않아 큰일났시다"('어민후계자 함현수'). 근래 동네 형아우들은 물 힘이 약해져 숭어도 새우도 안 잡힌다고 푸념한다. 온난화와 개발 바람 탓에 물살이 느려진 탓이다.
함민복은 재작년 집터에 펜션이 들어서면서 10㎞ 들어간 길상면 소재지 온수리에 월셋집을 얻어 옮겼다. 동네 동생들이 집 지을 터를 떼어 주겠다며 자기 땅 쪼개는 측량을 서둘렀지만 시기가 맞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삶의 궤적을 "충주 남한강서 한강 하구까지"라고 했다. 충북 중원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게 자랐다. 등록금 없이 먹이고 재워 주는 한전 부설 수도전기공고를 다녔다. 대신, 졸업 후 경북 월성 원전에서 4년 동안 발전설비를 돌렸다. 원전을 그만둔 뒤론 홀어머니 모시고 서울 셋방을 전전했다. 87년 스물다섯 살에 서울예대 문창과에 들어가 이듬해 등단했다.
함민복이 살던 곳엔 늘 재개발이 따랐다. 상계동·금호동에 이어 강화에서도 펜션 개발에 밀렸다. 그러나 그는 도대체가 누구 원망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소설가 김훈은 "가난과 불우가 그의 생애를 마구 짓밟고 지나가도 몸을 다 내주면서 뒤통수를 긁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강화의 역사, 물고기와 옛 고기잡이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생 보고 살아온 물때를 놓쳐 밀물에 빠져 숨진 어느 할머니 얘기를 꺼냈다.
모시조개는 물이 들 때 숨어 있던 굴에 숨구멍을 낸다. 할머니는 그 조개 잡을 욕심에 물 드는 것도 모르다 물골 따라 사방으로 들어온 물에 에워싸였다. 소리쳐 사람을 부르기엔 너무 멀리 나왔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시신을 찾아 헤맬까 봐 그물 매는 파이프에 몸을 묶었다. 물이 차오를 때까지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죽음을 앞두고 함지박에 담아 둔 조개들을 풀어주지는 않았을까….
함민복은 "강화도 살아보니 풍요로운 땅, 축복받은 땅이더라"고 했다. "썩지 않고 깨어 있으려고 사방에 소금물 울타리를 친 의지의 땅"이라고 했다. 강화도는 민족의 자존심이다. 서해로 밀어닥치는 외세(外勢)에 번번이 피로써 맞부딪쳤다. 그가 강화를 배우려고 역사연구모임에 나가 보면 50명씩 모여 빈자리가 없다. 은퇴한 학자부터 젊은 여성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진지하게 토론한다.
그는 돈도, 집도, 아내도, 자식도 없이 마흔여덟 해를 살아왔다. 원하는 게 별로 없고, 혼자 사니까 별 불편한 것도 없다고 했다. 다만 파스를 방바닥에 펴놓고 그 위로 몸을 굴려 등에 붙일 때면 외롭더라는 우스개를 하곤 했다. 그가 지난 6월 혼인신고를 했다. 동갑내기 신부는 그에게 시작(詩作) 강의를 듣던 이다.
부부는 길상면 소재지에서 조금 더 들어간 장흥리 오붓한 마을, 잔디마당에 깔끔하게 올라선 슬레이트집을 전세로 얻어 산다. 함민복은 지난겨울 술자리에서 동막 동생들에게 "죽으면 망둥이 밥 되게 갯벌에 뿌려 달라"고 했다. 가정을 이룬 그에게 앞으로 강화의 삶은 사뭇 다를 것이다.
'라이프(life) > 레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오은선 ‘칸첸중가 등정 의혹’ (0) | 2010.08.27 |
|---|---|
| 흔히 보는 석탑을 왜 쌓았으며, 돌탑과 차이는 뭘까? (0) | 2010.08.20 |
| 여행의 의미 (0) | 2010.07.17 |
| 경주 (0) | 2010.07.14 |
| 건강의 요점 : 잠, 햇빛, 등산, 물 (0) | 2010.07.12 |





